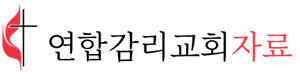2018년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에서 한 여성이 안락사를 선택했고, 이 안락사의 집행은 뜨거운 찬반 논쟁을 가져왔다. 20대의여성은 12살 때부터 우울증을 앓아왔고, 자주 분노를 느끼고 불안해하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았고,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고 환청까지 들리게 되자 네덜란드 안락사 기관을 찾아 2018년 1월 26일 안락사를 선택하였다. 많은 논란을 일으킨 이유는 현지 법상 안락사는 말기 암 등 극단적인 고통을 받고 있지만 고칠 수 없는 경우에만 안락사를 신청할수 있다. 과연 이 20대 여성은 이러한 기준에 해당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된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자료의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연합감리교회 자료의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한국의 존엄사법
2019년 한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80.7%가 안락사의 허용을 찬성했지만, 약 11.4%는 반대했다. 안락사 허용을 찬성하는 이유로서, 52%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권리이고, 35%가 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했다. 또한 안락사가 허락해야 할 때는, 진통제로도 고통을 막을 수 없을 때가 48.5%, 식물인간일 때가 22.4%,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12.2%, 스스로 거동할 수 없을 때 11%였다. 한국은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을 통해 죽음이 임박한 환자 본인 혹은 가족의 동의로 연명의료, 즉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중단하는 것만 가능하다.
용어
한국에서는 존엄사만 존재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다른 안락사 관련된 다른 용어들이 있다.
존엄사 –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흔히 존엄사법이라 불린다.
안락사 – 죽음이 예견되거나 통증이 극심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치사약을 주입해 생명을 끝내는 방식으로 환자가 요청해야 한다.
조력자살(사망) – 죽음이 가까운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치사약을 본인 스스로 주입해 생명을 끝내는 방식으로 의사 조력자살(혹은 사망)이라고 부른다. 조력자살만 허용하는 스위스나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의료진이 치사약을 주입하는 안락사와 구분한다.
이 외에도 환자가 직접 요구하는 자발적 안락사와 환자가 동의할 수 없을 때, 가족 등이 결정하는 비자발적 안락사로 나뉜다.
전 세계의 안락사
스위스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본인이 스스로 약을 주입하는 조력자살은 합법이다. 1941년에 세계 최초로 스위스에서는 조력자살이 합법화되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조력자살 하는 사람은 1999~2003년에 582명이 2014~2018년에 4,820명으로 약 8.5배가 늘었다. 또한 스위스에서 가장 큰 조력자살 기관인 엑시트(Exit)에서 2023년에는1,252명, 2022년에는 1,125명이 조력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최근 들어 유럽과 북미, 호주 등에서 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추세이다. 먼저 네덜란드는 2001년, 벨기에는 2002년 조력자살을 합법화하였으며, 질병에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는 2009년, 남미의 콜롬비아는 2015년, 캐나다는 2016년에 합법화했으며, 정신질환자까지도 대상에 포함한다. 이후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등 조력사망을 합법화하였다.
미국의 안락사
미국 50개 주에서 환자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환자의 안락사를 결정하는 비자발적 안락사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조력자살은 미국 내 10주에서 합법이다. 1994년 오리건주는 최초로 존엄사법을 제정했고, 1997년, 이 법이 실행되면서, 미국에서 존엄사가 가능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2023년까지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을 선택한 사람의 수는 2,454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조력자살을 위해 요건에서 오리건 주민이어야 한다는 거주 조건을 없앴다.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리건, 버몬트, 뉴멕시코, 메인, 뉴저지, 하와이, 워싱턴 등 10개 주에서 합법이다. 몬태나주는 조력자살을 허용한다.
또한 애리조나, 코네티컷, 플로리다,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욕, 펜실베이니아,로드아일랜드, 버지니아 등 총 14개 주에서 조력자살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존엄사의 현재 이슈들
1. 많은 국가가 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다.
소위 말해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선진국들 사이에서 존엄사를 합법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안락사 허용 요구가 높고 법적으로 허용된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으로, 아메리카에는 미국과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유럽에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 14개국이 일부 혹은 전면 합법화였다.
2. 정신질환자도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다.
안락사는 죽음이 예견되거나 통증이 극심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허락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는 정신질환까지도 조력자살을 적용하고 있다. 2023년 캐나다는 거식증,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조력 사망을 신청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27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은 신체질환보다 증상이나 고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또한 경제적, 심리적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3.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
애초부터 사람 존엄사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권리는 몇 살부터 가능할까?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벨기에는 2014년 세계 최초로 연령 제한을 없애 미성년까지도 안락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네덜란드는 12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확대하였다. 다만 안락사를 받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아동심리학자와 정신과 전문가가 보증해야만 한다.
4. 외국인도 허용된다.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스위스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조력자살을 허락한다. 스위스의 조력 자살은 스위스 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 외에는 조력자살을 규제하거나 제어하는 방법이 없어, “자살 관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023년까지 한인 10명이 스위스에서 조력자살로 사망하였고, 조력자살을 돕는 여러 단체에 가입한 한인만 약 300명이 넘는다.
안락사에 대한 연합감리교의 입장
한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사람들에게 안락사는 자살과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또 많은 사람이 찬성한다. 고통에 힘들게 생을 이어가기보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안락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권리처럼 보인다. 연합감리교회는 이와 같은 안락사와 자살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감리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끝내려는 모든 노력을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의도하신 풍성한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먼저 연합감리교회에게 죽음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니며, 항상 생명의 끝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영생을 얻을 준비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때 완화의료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임종을 앞둔 사람과 가족을 위해 연합감리교회는 기도와 영적 돌봄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능한 호스피스 돌봄을 권장한다. 그래서 임종 전에 죽음을 추구하는 대신, 고통 완화와 가능한 많은 희망, 사랑과 위로를 부여할 방법을 찾는다.
동시에 연합감리교회는 임종의 연장과 임종을 앞당기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며, 말기 혹은 치료할 수 없을 할 때,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연장하지 않기 위해 의사와 함께 결정을 내리는 개인과 가족을 지지한다.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