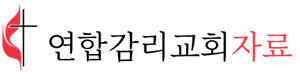지난 9월 23일, 한인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한인연합감리교회 미래 컨퍼런스에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의 사무총장인 장학순 목사는 한인연합감리교회 통계와 2023년 말까지 탈퇴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였다.
전체 한인연합감리교회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한인교회가 244 교회,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 회중이 36 회중으로 총 280 교회가 미국 전역에 있다. 또한 한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부교역자를 포함해서 약 270명, 타인종(타문화) 사역하는 목회자가 약 550명, 감독1명과 감리사가 20명, 연장사역자가 50명(휴직 포함)으로 섬기고 있으며, 전부 921명의 한인 목회자가 현직으로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섬기고 있다. 이는 은퇴한 목회자를 제외한 통계로써, 은퇴 목회자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목회자가 있다.
다음으로 장학순 목사는 ¶2553에 근거해서 2023년 12월까지 연합감리교회를 떠날 교회에 대한 전망도 발표하면서, "2023년 말까지 연합감리교회를 떠날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최소 40에서 최대 50 교회로서 약 280개의 교회 중 15~17%를 차지하며, 연합감리교회를 선택하고 남을 교회는 최소 230에서 최대 240 교회로 83~85%를 차지한다. 한인 목회자의 경우, 약 60명인 6~8%가 교단을 떠날 것이며, 92~94%의 한인 목회자는 여전히 연합감리교단에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연합감리교회 자료의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연합감리교회 자료의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통계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조심스럽게 발표된 전망이지만, 그중에서도 아직 탈퇴를 고민하고 기도로서 분별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와 목회자가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런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뉴저지 연회의 라라탄 쇼어(Raritan Shore) 지방의 감리사인 도상원 목사는 탈퇴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꼭 고려해야 할 4가지를 함께 나누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나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다. 연합감리교회도 그렇고 타 교단 역시 장단점이 있다.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 타교단이나 신생 교단에 가입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는 교회 자산에 대한 제도이다. 연합감리교단은 오랜 역사를 통해 건강한 제도를 가지고 투명하고 건강하게 교회 자산을 관리해 왔다. 어느 한 개인이나 소수 혹은 다수의 그룹이 교회 공동 자산을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교회 건물과 부동산을 팔거나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회나 연회의 재단이사회와 혹은 전체 연회의 투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교회 자산에 대해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며, 이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을 신탁조항(Trust Clause)이라고 한다. 종종 교인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부동산이 우리 교회 소유가 아니라 교단 소유일 수 있냐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신탁조항 제도가 왜 생겼는지 대한 역사적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신탁조항은 긴 역사를 통해 이런저런 사건을 거치면서 검증된 건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교회 자산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런 상호 책임 제도가 없는 최악의 경우, 교회 자산이 개인의 소유나 적은 소수 그룹의 사유화 될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타교단에서 이런 일들이 생각 외로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접하게 된다.
둘째는 목회자 파송이다. 연합감리교회의 결정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파송 제도이다.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목회자는 1년마다 파송을 갱신해야 한다. 청빙 제도, 즉 교회가 여러 목회자를 인터뷰하고 교인 투표를 해서 목회자를 선택하는 제도에 비해서, 파송 제도는 교회의 자율적 선택 권한이 없어 보이며, 불편할 수도 있다. 우리 한인 교인들은 자신들 교회의 신앙과 신학이나 문화와 잘 맞지 않는 목회자를 감독이나 감리사가 파송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염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단 탈퇴를 고려하는 교회나 교인 중에 감독이 우리 교회에 동성애 목회자를 보내거나 동성결혼을 적극 지지하는 목회자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연합감리교회의 감리사로서 본인의 경험으로는 신학적으로 교회와 잘 맞지 않는 목회자를 의도적으로 그 교회에 파송해서 교회를 해하려는 감독이나 감리사들은 없다. 이는 극단적 논리이다. 파송 제도를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정한다면, 타 교단의 청빙 제도에도 많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청빙 제도를 실시하는 교회들, 특히 한국에 있는 몇몇 교회에서 청빙 과정 중에 목회자 자리를 두고 전임 목사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새로 청빙되는 목회자와 담임 자리를 매매하는 일이 종종 있다. 혹은 청빙 과정에서 교회 의견이 나뉘어 여러 분파로 나눠지는 일들 역시 생겨난다. 파송 제도에 한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청빙 제도에도 역시 한계가 있다.
셋째는 목회자의 은퇴 연령이다. 담임 목회자의 연령은 교회의 잠재적 교인의 연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사실이다. 아무래도 같은 연령대에 공감이 이루어져, 젊은 목회자에게 젊은 교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선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시대의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목회자는 없다. 은퇴가 적정한 연령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교단에는 단기적으로는 교회의 안정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노령화, 교회 내 새로운 변화를 이루지 못할 위험성, 혹은 교회의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유화될 위험성 등이 있다.
넷째는 목회자 수급이다. 현재 40여 개의 한인 교회들이 소속된 글로벌감리교회에는 대다수의 미국 대표적인 유수한 신학교 졸업자들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해진 한두 개 신학교 학위나 프로그램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보수적인 신학만을 고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면 정해진 소수의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많은 유수한 능력을 지닌 전도사들과 부교역자들이 그 교단에서 안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글로벌감리교회에 소속된 교회에는 목회자 수급이 힘들 수도 있다. 이는 전도사들과 부교역자를 넘어서 담임 목회자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상황을 잘 모르는 한국에서 곧바로 온 목회자가 교회의 사역자들이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회의 제도적인 문제점은 잘 보여서 비판하기 쉽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섣부른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새로운 교단에서 시작하는 한인교회들이 신생 교단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미숙성을 잘 극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목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 교회와 교인들은 우리들의 자매, 형제들이었고 아직도 큰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동시에 연합감리교회에 남은 교회와 교인들도 현재의 연합감리교회의 제도가 오랜 역사를 거쳐 검증되어 온 좋고 투명한 제도임을 알고 자긍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안타깝지만 교단 탈퇴 과정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마치 일어날 현실인 것처럼 연합감리교회에 남은 교인들을 선동하는 일이 있었다. 이제 일단락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내년 2024년 총회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앞으로 도전을 헤쳐 나갈 때 한인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깊은 호흡과 단단한 내면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뿌리가 단단하게 내린 채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한다. 또한 혼잡한 시대에 단순 논리와 극단적 논리로 상황을 혼탁하게 하는 독소가 담긴 목소리를 잘 걸러내고 영적인 분별을 잘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지켜 나가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바는 먼 훗날, 아니 더 가까운 미래가 되길 희망하며, 서로 교단이 다르더라도 같은 기독교인, 더 나아가 같은 감리교인으로써 서로가 축복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도상원 목사는 뉴저지 연회의 라라탄 쇼어 지방 감리사로 섬기고 있다.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